기성세대는 늘 청년들의 '유행'을 기성질서의 해체의 관점에서 바라보곤 했었다.
18세기 소설이 유행하자, 기성세대는 청년들의 '독서 전염병' '독서 열병' '독서 조병(躁病)' '독서 욕정' 을 우려했다. 기성도덕질서의 해체를 우려했다.
세대간 갈등은 가치관, 세계관, 종교관, 정치적 이데올로기로부터 비롯된다. 여기에다 기성세대가 10-20대의 독립성을 인정하느냐 마느냐도 관건이다.
(1) 후세대가 늘 전세대보다 진보적이거나, 도덕과 정치적 관점이 더 훌륭하다는 것은 아니다.
(2) 어떤 변화가 생겼을 때, 기술,과학의 발달과 그것들의 악영향까지 포함해서, 기성세대는 새로운 세대의 '습관'과 삶의 양식 전반을 통제하려 든다.
(3) 판단기준은 사회적 진실 찾기에 어떤 세대가 더 진심이냐가 세대 갈등을 푸는 열쇠이다.
1980년대 한국에서는, 학생운동의 사회적 지적 도덕적 권위와 신뢰가 높았다. 그 이유는 1979년~1980년 군사쿠데타와 광주학살로 정권을 탈취한 전두환 정권에 맞서, 학생운동권 집단이 역사적 정치적 '진실'을 알리며, 그 부당하고 불의로 가득찬 전두환 독재정권과 정면으로 싸웠기 때문이다.
(4) 인터넷과 소셜 미디어의 등장, 미국의 IT업계의 헤게모니 장악 이후.
젊은 세대들이 이전 세대에 비해, 소셜 미디어와 같이 사는 시간이 증가하고 있다. 책을 읽는 시간이 줄어들고 있고, 실제 사유능력과 지적 능력, 학습 능력의 저하 현상도 나타난다. 하지만 '매체'라는 것은 과거의 산물, 구술, 책, 라디오, TV, 영화, 잡지, 그리고 소셜 미디어에 이르기까지 역사적으로 다양하게 진화발전해 왔다. 매체들끼리 서로 경쟁하기도 하고, 서로 '혼합'하기도 한다.
당분간 책같은 전통적인 '매체'와 지적 원천들이 새로운 매체들의 공세에 뒤로 밀려날 가능성은 다분하다.
하지만 역사적인, 재래식, 전통적인 '지적 자원들'과 '매체들' 역시 유튜브 등과 같은 새로운 매체와 공존할 것이다.
어떤 측면에서 책의 중요성이 더 증가할 수도 있다. 책은 유튜브라는 매체의 내용을 채우고, 제작과정과 결과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In the 18th century, the rise of the novel sparked widespread concern among influential individuals about young people's excessive reading habits.
This phenomenon was labeled an "epidemic" and referred to by various terms such as "reading rage," "reading fever," "reading mania," or "reading lust."
The surge in novel reading was seen as a moral threat, with fears that it led to sensation-seeking, morally dissolute behavior, and even acts of self-destruction. Reports of this "epidemi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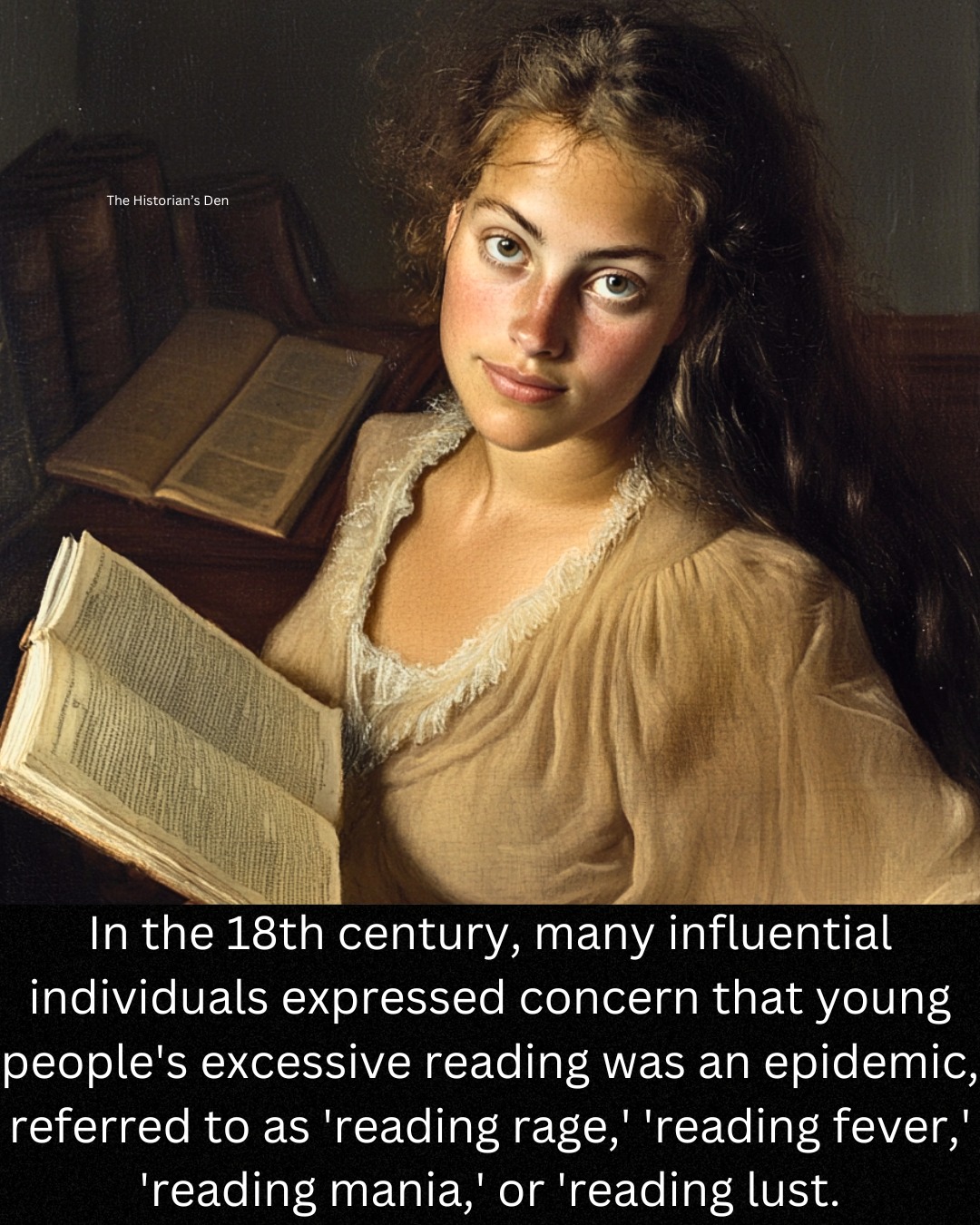
반응형


